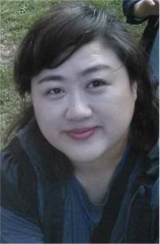
바윗돌들이 허공에 넙죽 엎드려 있다. 뼈마디 툭툭 불거진 장대석들이 육중한 등을 구부려 오체투지의 절을 하는 것 같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팔다리도 없이 몸통만 남은 돌들이 두 가닥으로 다닥다닥 엮여서는 서로의 몸을 잇대었다. 마음을 나누는 듯, 어깨를 기댄 듯 타래를 이룬 돌들의 둥근 맞물림이 포옹처럼 따스하다.
숙종 39년(1713)에 축조된 청도 석빙고를 보러 갔다가 만난 네 개의 홍예다. 돌을 틀어 무지개 모양으로 만든 다리가 가로 15미터, 세로 5미터의 네모반듯한 빙실 위에 둥실 떠 있다. 삼백 년 남짓한 빙고도 모진 세월엔 장사 없었나 보다. 숱 많던 봉토는 유실되고 지붕을 덮었던 판석들도 대부분 사라져 돌방무덤 같은 속이 휑하니 들여다보인다. 골격은 그대로다. 홍예는 어떻게 그 오랜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걸까. 못을 박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중력을 과감히 거스르는 불가사의한 비밀을 범부가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열쇠를 푸는 실마리는 돌의 생김새에 있었다. 사다리꼴을 엎어 놓은 듯 아랫변이 윗변보다 좁게 생긴 홍예석을 양쪽에서 차곡차곡 쌓다 보면 단단하기로 소문 난 쑥돌도 꽃봉오리처럼 모양이 오므려진다. 좌우의 비례가 딱딱 맞다 싶더니 갑자기 맨 꼭대기 자리 하나가 텅 비며 성마른 가슴을 만지고 간다. 놓칠세라 최후의 홍예석을 쐐기처럼 박아 넣는다. 홍예를 완성하는 그 마지막 돌을 석공들은 특별히 이맛돌이라고 불렀다.
어깨가 유달리 넓어 보이는 이맛돌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중심에 딱 서서 다른 돌들을 단단히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자처한다. 사방에서 누르는 힘을 이쪽저쪽으로 분산시킬 뿐 아니라 다른 홍예석을 뻑뻑할 정도로 끌어안는다. 떠오르거나 내려가는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만약 이맛돌이 없었다면 돌들은 서로 샅바를 잡고 힘자랑만 실컷 하다가 안다리걸기 한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원석이 여럿 있었다. 깨알 같은 글씨가 박힌 책을 표지가 너덜해질 때까지 읽어 대고,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할 때도 우르르 함께 몰려다녔다. 오며 가며 인사성도 밝으니 동네 사람들은 될성부른 떡잎이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머니도 훗날 우리가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흙다짐 위에 넙데데한 널돌을 깔아 바닥을 만들고, 막돌을 빼곡히 쌓아 벽을 세워서 바윗돌들의 든든한 요람이 되어주었다.
돌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경영학을 전공한 오빠가 저만의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다.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짓기 위해 제 살던 집도 팔았다. 그래도 역부족이었던지 친정집까지 담보하려 들자 어머니의 근심이 깊어졌다. 오빠는 선뜻 손 내밀어주지 않은 부모님이 몹시 서운했던 모양이다. 어렵사리 사업이 자리 잡은 후로도 데면데면 잘 웃지 않았다.
석빙고는 홍예를 쌓아 천장을 둥글게 만든 후 진흙과 잔디로 두툼한 봉분을 얹는다. 햇볕 차단 효과를 넘어서 청도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을 입구 아래쪽으로, 더운 공기는 위쪽으로 자연스레 흘려보내기 위해서다. 홍예보 사이사이의 움푹한 공간에 가둬진 공기는 웅성거리기 무섭게 천장에 뚫린 환기구로 쑥 빠져나갔다. 덕분에 빙실 안은 염천 삼복중에도 적정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세상만사 공기 흐르듯 소통했어야 했는데 요령도 대화도 없었던 그 무렵의 우리들은 사방이 꽉 막힌 직육면체 상자나 다름없었다. 나는 나대로 장남이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싶어 퉁퉁거렸다. 섭섭함이 마음속 동굴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한 세월은 무관심을 낳고 그 무관심은 다시 몽우리 맺힌 원망으로 순환한다. 그 사이 지난날 그토록 투명하고 단단했던 띠앗은 진창으로 녹아 질척거리고 있었다.
시 그르고 때늦어, 우리들이 덥석 손 내밀며 마주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깊은 병에 든 후였다. 빙고의 바닥이 경사진 이유는 녹은 얼음물을 수로 밖으로 즉시 흘려보내기 위해서다. 어머니의 빙고는 그러질 못했다. 행여 자식들이 책잡힐까 혼자 시름시름 가슴 앓느라 변변한 배출구 하나 갖지 못했다. 마침내 얼음 저장고로서의 기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후에야 화들짝 놀란 바윗돌들은 반쯤 무너진 빙고 곁에 앉아 뻐근한 가슴팍만 두드렸다.
언젠가부터 돌과 돌들이 깍지를 끼기 시작했다. 돌들을 가장 먼저 아우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빠였다. 팔백 리 떨어진 길도 마다치 않고 주말마다 내려와 어머니 얼굴을 정성스레 어루만지더니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가족들까지 토닥거렸다. 대소사는 물론 동생들의 힘든 일도 발 벗고 나서서 해결했으며, 때로는 왁자그르르 열여섯 대가족의 모임이나 여행을 주선했다. 기댈 수 있는 구심점이 생기자 흩어져 있던 돌들도 하나둘 한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릴 때 정이 소록소록 되살아나며 웃음꽃은 활짝 피어났다.
홍예석이 우리 형제들이라면 이맛돌은 오빠이다. 그간의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미안하다, 고맙다”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으니 우리가 모르는 동안 크고 아름다운 홍예 하나 만들어지고 있었다. 세느강의 다리나 로마의 콜로세움 못지않은 아름다움에는 직선을 고집하지 않은 휘어짐과 더불어 무조건적인 껴안음도 한몫했으리라. 꼭 가슴 부분을 포개야만 포옹이랴. 어깨든 등이든 단지 끌어안는 행위만으로도 각자가 지닌 능력 이상의 견고함을 발휘하는 홍예를 보면 앞으로 또 어떤 고난과 아픔이 닥친다 해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항상 초승달 같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홍예는 결속과 포용의 상징 아닐까. 숭례문이나 불국사의 백운교처럼 돌을 아우르거나 하중을 감당해야 하는 곳엔 언제나 둥근 껴안음이 있었다. 산자락을 뚫는 터널이나 몸을 지탱하는 발의 뼈도 알고 보면 반원의 아치다. 모으고, 끌어안고, 버티는 포옹의 힘! 거기에 살포시 곁들인 미소까지 돌의 숨은 매력은 한정 없다 싶다.
살을 붙이고 뼈 구조를 가늠하며 수백 년 전의 풍경을 떠올려 본다. 장빙제를 지낸 울력꾼들이 강에서 뜬 얼음을 소달구지에 가득 싣고 석빙고로 향하나 보다. 엿가락 같은 운빙 행렬이 천변을 따라 출렁이고 있다. 얼음을 잔뜩 먹은 빙고는 이내 배가 부를 테지. 사람 사는 세상 대척점에 서기보다 끌어안음이 중요하다고 삶의 정수 하나 깨달은 내 얼굴에도 무지개 닮은 미소가 방실 떠오른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