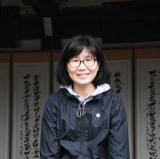
낯섦이 낯익음으로 전환하는 순간이 있다. 무섬에 낯가림처럼 비가 내린다. 토담에 얹힌 기와는 이끼를 키우는 중이다. 젖은 이끼가 푸른 그림자처럼 누워 있다.
무섬마을(경북 영주시. 중요민속문화재 제278호)은 생명의 땅이다. 강물이 어머니 자궁처럼 양수로 흘러 돈다. 섬을 낳은 내성천이 모강(母江)이겠다. 본디 내가 포태된 고향이다. 낯섦이 밀려난다. 아기집 같은 태곳적 아늑함으로부터.
물길에 갇힌 고립이었다. 유배자의 시간처럼 세월은 느렸다. 무섬사람들의 사람살이가 옛 모습 그대로인 까닭이다. 유폐된 어둠이 밝은 빛을 낳았다. 빠른 세상에 느린 마음이 빛을 쬔다. 예스러운 선비마을에서 내 마음이 안도한다.
가느다란 금 하나가 강을 가로지르니 외나무다리가 선다. 모체와 세상을 잇는 탯줄이 되었다. 고립무원이 아니었다. 다리가 무섬을 키운 거다. 삶을 꾸릴 수 있는 터전으로서 말이다.
외나무다리는 숨이기도 하다. 숨은 생존한다는 위안이다. 다리가 무섬사람들에게 정신의 숨도 가르쳤을 테다.
연암(燕巖)은 ‘소리와 빛은 외물(外物)이니 외물이 눈과 귀에 누가 되어 사람이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며,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나는데 험하고 위태로움이 강물보다 심하니 보고 듣는 것이 병이 된다’고 통찰했다. 무섬마을 사람들이 연암(燕巖)을 알았는지 알 수는 없다. 웅숭깊은 사유를 짐작할 뿐이다. 물길에서나 외길에서 이미 터득했을 지혜이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이 그들의 유산이리라.
삼백오십 년이 넘는 시간이 나무다리에 압축되어 저장 중이다. 숨통 같은 소통의 기억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명암(明暗)의 그림자처럼 고락(苦樂)이 동행한다.
꽃가마 타고 들어온 신부는 죽어서야 꽃상여를 타고 다리를 건넌다. 뒤를 따르는 구슬픈 곡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진다. 과거 보러 떠나는 선비의 재우침이 낙방하여 쳐진 안쓰러움으로 돌아온다. 한때 파락호였던 왕의 아버지도 좁은 외길을 걷는다. 붓 하나로 해우당(海愚堂) 현판을 역사에 남기고 기척 없이 떠난다. 그를 잡으려는 발걸음이 다급하다. 개화사상가의 발길이 오헌(吾軒)고택에 이르니 사랑방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상이 합방하는 불빛이다. 아도서숙(亞島書塾)으로 향하는 독립운동가의 뜨거운 호흡은 은밀한 여정으로 이어진다.
흔적은 전통이 된다. 삶의 냄새가 초가지붕의 호박넝쿨처럼 넌출진다. 돌담 밖에서 까치발을 한다. 담 너머 노인이 구경꾼을 구경한다. 고샅을 돌아가니 또 길이다. 길은 어디에서든 둥글게 이어진다. 검박한 기와집 툇마루 아래 장작이 쌓여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굴뚝엔 연기가 그리움을 피울 게다. 흙집 문을 열면 가난하지만 정갈했던 고향집처럼 품어줄 것 같다. 아기고양이가 토방에서 뒹군다. 낯선 객이 두려운 모양이다. 미물들의 순한 눈빛도 기록이 된다. 사람살이가 엮는 공간과 시간이 그대로 박물관이다.
무섬(水島)은 무섬(無島)을 낳았나 보다. 고택들이 음전하다. 기와집은 겉치레와 위세가 없다. 초가집은 빈곤이 없고 천하지 않다. 담이 없고 있어도 높지 않다. 불통이란 싹은 자랄 수 없다. 무섬의 없음은 있음의 다름 아니다. 소박함과 풍요의 있음이요, 소통과 겸양의 있음이다. 없는 것이 많으니 실존이 더 잘 드러난다.
무욕의 사람살이를 훔치고 싶다. 무심한 이들이니 무섬(無島)임을 알지 못할 테다. 움켜쥔다고 나의 결핍이 채워질까. 정신이든 물질이든 이제는 욕망의 밀도를 낮춰야 하리라. 채우기보다는 비워내기를 잊지 말아야 할 텐데. 움켜쥔 손아귀의 힘을 푼다.
하늘의 변주가 유별나다. 구름장막이 두터워지며 모였다가 흩어진다. 햇살이 구름을 제치니 초가지붕이 환하다. 기와지붕 위로는 먹빛 구름이 비를 뿌린다. 인생의 일기를 예보하는 하늘의 큰 그림인가 싶다.
붉게 핀 백일홍이 함초롬하니 종가 후원을 지킨다. 종부의 삶을 닮아가는 중일 게다. 종부는 하늘을 우러르며 무탈한 나날이길 주문(呪文)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희로애락이 순서 없이 안방을 두드릴 때는 말없이 맞아주겠지. 고난이 찾아와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고난이 아닌 것이다. 그때 찾아오는 즐거움은 흔들림 없는 평안일 것이다. 무섬 여인들이 던져주는 무언의 가르침을 새긴다. 이제는 나도 낯가림했던 녹우(綠雨)를 녹우(錄友)로 맞아줘야겠다.
외나무다리 위에 선다. 갓길인 비껴다리가 가르침을 준다. 양보를 모르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다고. 중심을 잃으면 물속으로 곤두박질이다. 행선(行禪)의 시간이다. 몰입해야만 낭패를 면한다.
강 중심에서 거센 물결을 만난다. 어지러움이 기습한다. 느닷없이 물멀미라니, 감각세포들의 불협화음이다. 두려움 때문일 게다. 강파른 감정들을 재운다. 물이 두려워지는 시간을 지나야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참을성 있게 나가야 한다.
내 안에도 외나무다리를 세운다. 글을 짓듯이 다리를 짓는다. 아침마다 눈뜨며 별일 없는 일상을 바라지만 된비알 같은 날은 있게 마련이다. 두려움으로 눈 감고 싶을 때가 있다. 빠른 걸음으로 허방 짚을 때도 있다. 그런 날이면 나만의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하리라. 숨 한번 몰아쉬는 동안이라도 볕뉘 같은 평안의 순간이 와주기를 기대한다.
별리의 순간이다.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를 무섬에 남겨두고 떠났던 시인의 별리는 애잔했다. 무섬사람들과 나와의 별리는 인연의 처음이다. 배롱나무 옆에 그림자처럼 내가 서 있다. 떠나는 나에게 손을 흔든다.
마을 뒷산에 걸린 구름이 비를 거둔다. 무섬에서 평안한 나의 하루가 지나고 있다.
※<열하일기 - 산장잡기(山莊雜記) 편>에서 인용. 박지원 作.
※해우당<海愚堂>현판- 흥선대원군의 글씨.
※개화사상가 박규수를 말함. 오헌고택의 현판을 쓴 것으로 전해짐.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 시 <별리>에서 인용. 조지훈 作.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